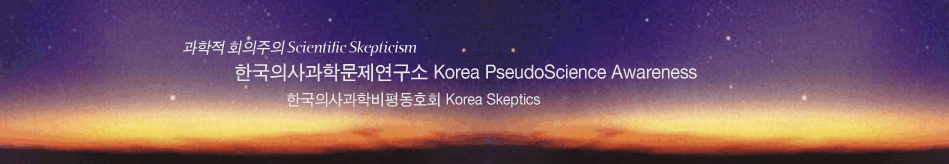|
|
 |
 |
|
|
과학적, 비과학적 의학
|
| 혈우병 치료제 바이러스 불활성화 미비 사고에 대해 |

 |
|
| 글쓴이 : kopsa
날짜 : 05-11-16 20:09
조회 : 5640
|
|
|
혈우병 치료제 바이러스 불활성화 미비 사고에 대해
혈우병 치료제의 에이즈 바이러스 오염 사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80년대 초
제조 공정에 바이러스 불활성화 과정을 도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뒤에 불활성화 공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의 미비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글
은 공정 미비 문제를 다룹니다.
1. 바이러스 불활성화 공정
혈우병 치료제 제조 공정에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열처리 방법과 냉멸균
(cold sterilization)이라고도 부르는 화학적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창기 미국에서 혈
우병 치료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의 소송에서 제조사는 당시의 체계 내지 제조 상
황을 들어 불가항력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열처리 방법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소급하면 1940년대부터 간염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 열처리가 알려져 있는데도
이 방법을 혈우병 치료제에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하여 혈우병 환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열처리 방법 외에 화학처리로는 녹십자에서 사용하는 S-D(solvent-detergent) 방법이 대표
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 1985년 뉴욕 혈액센터에서 개발하여 항혈우병 인자
(AHF) 농축물 제조에 사용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상세한 S-D 과정이 나와 있는데 생화학
실험과도 유사합니다. 모든 단계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약이 정확
히 제조되고 각 단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시험 검증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열처리 불활성화 사고
1980년대 중반에는 미 보건기관 등이 열처리를 강조하고 그 후 혈액제제는 열처리하여 생
산되었습니다. 미국 아머(Armour)도 열처리하여 8인자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1985
년 6월까지 아래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열처리 제품임에도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서 에
이즈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아머는 아마도 공정상 문제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일지 모르나, 뉴욕 혈액 센터의 앨프레드
프린스라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게 했고 프린스는 아머의 열처리 공정에 의해 에이즈 바이러
스가 완전히 죽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가 이 문제를 잡지에 발표하려고
하자 아마도 아머는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
국 1986년 5월 프린스는 아머라는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발표했습니다.
3. 아머 재판 진행 중
그리고 아머는 1986년 9월에 모든 8인자 제품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프린스에 의해
열처리 문제가 파악 된지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물론 아머는 그 동안 보건기관에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아머의 문제는 미국 보건기관도 아머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
한 캐나다로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열처리의 미비가 문제였다고 해도 즉시 제품을 회수했으면 문제는 최소화되었을 것인데 이
들은 문제를 알고도 1년이나 제품을 판매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머는 프랑스의 유명
한 롱프랑로러의 자회사이니 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2002년 11월 캐나다 경찰은 보상과는
별개로 아머 등을 형사 입건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다른 게시 글에도
있습니다.
4. 유럽 PPSB 사고, 화학적 불활성화
처음에 9인자인 경우는 PPSB (prothrombin + proconvertine + Stuart's factor +
antihaemophilic factor B)를 투여한 모양입니다. 유럽에서 1985년부터 PPSB를 투여한 환
자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독일 보건 당국은 1987년 2월에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로 하여금 베링사의 열처리 불활성화 공정을 검토하게 했고 공정 미비로 판정되
어 관련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로, 1990년으로 들어올 때 독일 비오테스트(Biotest)의 PPSB 문제가 보고
됐습니다. 이 제제는 미국의 혈장을 사용했는데 미국에서 1989년 3월과 5월 혈장에 에이즈
양성 환자의 혈액이 섞였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비오테스트는 1989년 6월 이것을 사
용하여 PPSB를 제조하여 1989년 10월 시장에 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 4월에
이 제품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오테스트는 이 PPSB 제조에 화학적 불활성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화학적 방법으로는
앞서 S-D 법이 대표적이고 또 바이러스를 광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감작
제를 넣은 다음에 UV를 조사하는 방법인데 당시 비오테스트는 1960년 로그리포
(LoGrippo)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베타-프로피오락톤이라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과 UV 조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5. 비오테스트 9인자 문제
로그리포의 방법은 혈액 제품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당시는 많이 사용된 것 같습
니다.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테스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활성화 용
량을 초과한 바이러스가 혼입됐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회수되고 보건
기관은 비오테스트의 PPSB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비오테스트는 그 이전부터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나 로그리포 불활성화 방법을 사용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파울 에를리히 연구소의 쿠르트(R. Kurth) 교수가 이미 1986년 11
월에 이 방법이 불활성화 정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에서
는 파울 에를리히 연구소를 심문하여 앞으로 이런 문제가 보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쿠르트 교수의 1991년, 1992년 논문을 찾았는데(조영걸 교수의 힌트가 있었습니다),
같은 오염된 혈액으로 제조된 제품을 투여 받은 48명의 혈우병환자(최소 인원) 가운데
9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투여량 등 동일하지 않으므로 같은 오염
제제라고 해서 모두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6. GMP의 엄격함, 결론
미국에서는 유명 기업체의 제품도 회수 조처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
제품의 경우 2001, 2002년 FDA는 1850 가지(어느 곳의 혈장, 알부민 등 식입니다)의 제
품을 회수 조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품질관리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적십자
사 단계의 검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GMP 검사가 무엇인지는 바이엘의 2세대 재조합 8인자 Kogenate FS와 관련하여 2000년
FDA의 GMP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품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 FDA의 지적은, 생산 종업원에 대한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다, 종업원이 원료 물질 시험
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 제조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조사가 부족하다, 제조 과정 중
미생물 오염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제조 과정의 박테리아 모니터링 결과가 들쑥
날쑥하다와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D 불활성화 공정을 채택한다고 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공정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의
GMP 검사는 수시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전에 말했지만 FDA는 GMP 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제조사와 관련 책임자를 형사 고발 조처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
를 종합한 것인데, 초고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하면 문의하시고 옮겨 게시하지는 않았으
면 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