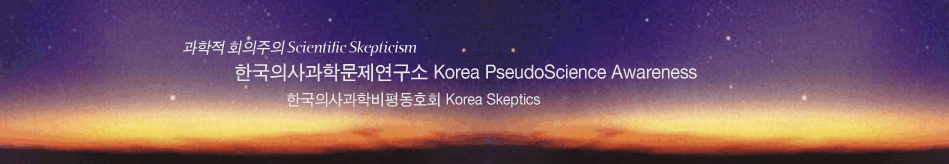|
|
 |
 |
|
|
동서양 대체의학
|
| '과학적 진단장치의 발명' |

 |
|
| 글쓴이 : kopsa
날짜 : 99-11-05 19:46
조회 : 7678
|
|
|
약업신문사 <의약정보> 1998년 3월 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이 글 다음에 2회에 걸쳐 대체 진단법을 게시합니다.
'과학적 진단장치의 발명'
히포크라테스의 질병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다.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여러 종류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4체액의 불균형 하나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런 관찰에 의해 환자에 따라 구별되는 증세가 나타나며 일정
한 복합적인 증세에 따라 병이 일정한 경로를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오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 다시 말해서 질병의 예후를 말할 수 있었으
며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1. 과학적 병진단의 출발
16세기 과학혁명과 더불어 병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질병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주장은 처음 스위스의 파라켈수스(Paracelsus)에서 나왔으나
인정받기는커녕 갈렌학파에 몰려나는 운명을 맞았다. 과학적 방법이 탄생한 17
세기에 들어와 '영국의 히포크라테스'라고 불리는 시데넘(Thomas Sydenham)은
질병에는 각각 구별되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마치 생물학자가 개개 동식물을 구
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의사들은 조심스러운 관찰에 의해 개개 질병을 확인해 낼
수 있다고 재 천명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시데넘은 환자가 나타내는 병 증상은 병에 대
한 인체의 투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개 질병에 대해 인체가 수행하는 투쟁은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병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스스로 성홍열, 홍역, 천연두, 말라리아, 통풍
등을 증상으로 자세히 규정하였다.
점차 의사들은 예를 들어 맥박이 빠르게 뛴다던가, 열이 난다는 데에 만족하
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열의 정도는 어떤지 등등의 정량적 개념을 갖고
증상을 기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전은 세밀한 질병의 구분과 진단의 정확
성을 가져다주었으며 질병을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는 발판을 놓았다. 이런 목
적을 위한 진단장치 중에서 체온계, 청진기, 혈압계가 처음에 나온 것이다.
2. 체온계, 청진기, 혈압계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나온 것은 16세기 갈릴레오에 의해서이다. 이때의 온
도계는 조잡한 것이었다. 온도계의 출현은 자연히 체온의 측정으로 이어졌는데
갈릴레오의 온도계를 향상시켜 1614년 체온을 포함한 <통계의학 기술>을 저술
한 사람이 파두아 대학의 산토리오(Santorio Santorio)이다.
그러나 아직 17세기에도 온도계의 눈금이 통일되지 못해서 30개 이상의 서로
눈금이 다른 온도계가 있었다. 이를 통일한 사람이 주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한
독일의 기기 제조가인 파렌하이트(Daniel Fahrenheit)이다. 그는 1709년 알코올
온도계, 1714년 수은온도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화씨 온
도계이다. 이와 같은 온도계가 나온 후 네덜란드의 식물학자며 의사인 부르하
베(Hermann Boerhaave)는 이를 열 환자의 체온 측정에 이용하였다.
체계적으로 질병과 체온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한 사람은 19세기 라이프치히
의과대학 교수인 분더리히(Carl Wunderlich)이다. 그는 2만 5,000명의 환자의
자료에 기초하여 1868년 <질병에서의 체온>을 출판하였다. 당시 체온계가 어
떤 것인지는 그가 처음에 사용했던 체온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길이가 1
피트였으며 한번 측정에 20분이 소요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1867
년 영국의 올벗(Thomas Clifford Allbutt)으로, 그는 6인치 체온계를 만들어 정
확도와 측정시간에서 체온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고대인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병진단에 중요시하였다. 그리스인도 귀를 가슴에
대어 허파와 심장고동 소리를 들었다. 이 방법은 잊혀졌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되어 19세기에는 청진기가 생겨났다. 최초의 청진기의 발명자는 라에네크
(Rene' Lae"nnec)이다. 프랑스 네케르 병원의 수석 의사로 있던 1816년에 라에
네크는 심장에 이상을 가진 살이 많이 찐 여인 환자를 맞았다. 이 여인의 가슴
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데 당혹감을 가진 그는 종이를 원통모양으로 접어서
여인의 가슴에 대고 소리를 들었더니 심장고동이 이전에 어떤 환자에게서 듣던
것 보다 선명한 것을 알았다.
그는 곧 종이 원통대신에 길이 9인치, 직경 1.5인치의 나무로 된 관을 만들어
청진기로 사용하였다. 라에네크는 허파, 심장, 혈관계 질병의 진단에 청진기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으며 허파와 심장 음을 기술하는 용어도 그가 처음 만들어내
었다. 양쪽 귀에 고무관을 연결한 양이 청진기는 1852년 미국의 의사 캄만
(George Cammann)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동맥을 잘랐을 때 일종의 압력 하에 있는 것처럼 혈액이 분출한다고 기술한
하비의 1628년 내용에 관심을 가진 영국의 헤일스(Stephen Hales)는 1733년에
말 동맥 속으로 1피트 유리관을 삽입하여 유리관에 올라오는 혈액의 높이로 최
초로 혈압을 측정하였다. '식물생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헤일스는 뉴턴의
실험철학에 따라 양적 측정의 중요성을 안 사람으로, 식물학자이며 화학자인 그
가 혈액 순환과 혈압에 관한 책을 저술한 내용은 흥미롭다.
그후에 압력 측정법도 향상되었고 혈압이 몸의 어떤 부위에서 측정하건 동일
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나 몸밖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장치는 최초로 1881년
에 독일의 바슈(Samuel Siegfried von Basch)에 의해 발명된 것이다. 바슈의 장
치는 아직 정확성 면에서 뒤떨어진 것이나 15년뒤에 공기로 부풀릴 수 있는 팔
밴드를 가진 모델을 개발한 이탈리아의 의사 리바-로치(Scipione Riva-Rocci)에
의해 향상되었다.
3. 맥박계, 심전계, 뇌파기록계
영국의 의사 맥켄지(James Mackenzie)는 한 임신한 젊은 여성이 급작스런 심
장발작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심장작용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심장작용
을 기록할 필요성을 알고 동맥과 정맥의 맥박을 기록하기 위한 폴리그라프를
개발했으며 이 기록과 심순환계 질병과의 상관성을 찾았다. 맥켄지는 특히 심방
성세동의 불규칙성을 기술하였고 이 질병에 디기탈리스가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
다. 1908년 폴리그라프와 그 응용을 기술한 <심장질병>은 심장학의 이정표를
놓은 책으로 꼽힌다.
네덜란드의 아인토벤(Willem Einthoven)이 레이덴 의과대학 교수가 된 다음
해인 1887년에 영국의 월러(A.D. Waller)는 심장전류를 발견하였으나 이때에 사
용된 장치는 감도가 낮고 사용에 번거러운 것이었다. 물리학에도 흥미가 있었던
아인토벤은 감도가 높은 현전류계를 고안했는데 이것은 자석의 양극사이에 줄을
연결하여 전류가 줄을 통과할 때의 휘어짐을 광학적으로 확대하여 기록하게 한
것이다.
1903년 아인토벤의 최초의 심전도(ECG)를 기술한 논문에 나타난 장치는 은으
로 도금된 석영 섬유를 연결한 275Kg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었다. 이 업적으로
아인토벤은 1924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으며 1928년까지 휴대용 14Kg 무게의
심전계가 만들어 졌다. 아인토벤도 여러 환자의 심전도를 얻어 이것을 청진으
로 얻은 심음 및 잡음기록과 비교하였으나 심전계를 사용한 병진단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 영국의 루이스(Thomas Lewis)이다. 그는 심전도를 해석하는 방
법을 연구하여 심장병의 진단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정신병리학자 베르거(Hans Berger)는 두개 표면에 전류계를 놓고 측정
하여 1924년 뇌파를 검출하였다. 그의 최초의 뇌파기록계의 발견은 처음에는 무
시되었으나 10년 후에 영국의 생리학자 에이드리언(Edgar Adrian)에 의해 간질
병 등 뇌질환의 진단에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에이드리언은 1.5km 선을 사용하
여 그의 실험실에서 병실환자의 뇌전도(EEG)를 얻기도 했다. 그는 신경계의 구
조와 기능을 연구한, 시냅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영국의 생리학자 셰링턴
(Charles Scott Sherrington)과 공동으로 1932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4. X-선 진단
뢴트겐(Wilhelm Konrad Roentgen)은 독일에서 출생했으나 3살 때에 네덜란드
로 이주하여 그곳 국민이 되었다. 취리히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한 후에 1888년 뷔르츠부르크 물리학교수로 부임하였다. 1895년 뢴트겐
은 어두운 방에서 음극선의 성질을 연구하던 중에 방전관을 싼 검은 판지를 통
과하는 어떤 선에 의해 실험대위의 물질이 형광을 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납만이 이 선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납을 손에
쥐고 실험하던 중에 손가락의 윤곽 속의 뼈가 진하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뢴트겐 부인의 손을 사진 찍어 확인되었다.
뢴트겐은 이 발견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뷔르츠부르크 물리학-의학 협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때 새로운 선을 X-선이라고 이름 붙였다. X-선은 언론의 보도
를 받았고 1896년 1월에 이 이야기는 전세계로 퍼졌다. 그는 갑자기 유명하여
졌으며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러나 뢴트겐은 대단히 겸손
하여 독일 정부에서 수여한 '폰(von)'이라는 명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를 거절하
였으며 노벨 상금을 뷔르츠부르크 대학에 기부하여 과학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X-선을 뢴트겐선이라고 부르는 데에 반대하였다.
뢴트겐의 발견은 물리학, 화학, 의학 등 과학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다. 의학의 경우 처음에는 뼈만을 관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자세한 병
소 부위의 진단에 적용이 확대되었다. X-선을 이용한 장 관찰은 1896년 당시 의
과대학생이었던 미국의 캐논(Walter Cannon)이 실험동물에 비스무트 염을 먹여
형광스크린에 나타난 장을 관찰한 것이 처음이다. 1904년에는 안전한 황산바륨
을 먹여 인간의 장 진단도 가능해 졌다. 이 진단은 수십 년간 사용되었으나 그
후 개발된 내시경 법이 좀 더 유용하다.
5. 초음파 진단, 내시경
초음파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높은 진동수의 음파를 말하며 어떤 결
정을 교류전기장하에 두었을 때에 공명에 의해 유발되는 진동이다. 초음파는
수중에서는 잘 전파되나 고형물체를 만나면 반향을 돌려보낸다. 초음파의 방출
시간과 반향의 검출시간의 차이가 그 물체의 거리를 나타내며 물체의 음반사 성
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반향을 검출할 수 있다.
초음파의 반향을 이용한 잠수함 탐지기술은 제1차 대전 중에 연구되어 1920년
에 장치가 만들어졌다. 자궁 속의 태아가 물 속의 잠수함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초음파를 태아의 발달 관찰에 이용할 착상을 한 사람은 1950년대 도널
드(Ian Donald)이다. 특히 이 시기는 X-선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때와도 관
련된 것으로 안전한 진단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초음파는 인체를 투과하여 조직의 흡수 정도에 따라 다른 반향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내부 구조의 판별이 가능하다. 도널드는 처음에 예를 들어 여러 다른 형
태의 복부암을 판별하여 수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태아의 발달과 질병의 진단 그리고 임신판별에 적용되었다.
X-선법의 문제를 탈피한 초음파 진단 장치의 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위궤양과
같은 질병에는 적절한 진단법이 없었다.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내시경
법이다. 이 방법은 접안경, 렌즈, 시야를 밝혀주는 광원으로 구성된 장치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내시경의 원형은 1806년에 프랑크푸르트의 보지니(Phillipe Bozzini)
가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관을 삽입한 것이 처음이지만 1950년대 광섬유를 사용
한 장치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965년에 영국의 광물리학자인 홉킨스(Harold
Hopkins)는 막대렌즈를 이용하여 이전의 망원경 원리보다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6.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 영상법
1967년에 영국의 컴퓨터 전문가인 하운스필드(Godfrey Newbold Hounsfield)
는 인체와 그 안의 장기를 3차원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컴퓨터 단층촬영 (CAT 또는 CT)인데, 좁은 X-선 빔을 조
사하여 얻은 여러 단층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목표부위를 3차원의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때 밀도정도에 따라 X-선 흡수가 다르므로 조직이 구별된
다. 하운스필드는 1979년 남아공의 물리학자 코맥(Allan Macleod Cormack)과
공동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코맥도 독립적으로 이 연구를 하였다. 공학자
가 노벨 의학상을 받은 진기한 예이다.
원자핵의 자기적 성질은 1920년대 말에 알려진 것이나 1946년에야 스탠퍼드의
블로흐(Felix Bloch)와 하버드의 퍼셀(Edward Mills Purcell)이 독립적으로 핵자
기 공명(NMR) 장치를 개발하여 응용이 가능해 졌다. 두 사람은 이 업적으로
195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NMR법은 원자핵에 자기장 내에서 에너지를 조
사하여 공명에 의한 원자핵의 에너지상태의 전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원자핵
을 주위의 전자적 성질에 의해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의학에 적용되기까지 공헌한 인물이 영국의 화학자 리처즈(Rex
Edward Richards)이다. 1940년대 말부터 NMR을 연구한 그는 1960년대 말부터
는 생물학적 분야에 적용하는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리처즈는 1970년대
탄생한 자기공명 영상법(MRI)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MRI는
CT와 마찬가지로 3차원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X-선법에 비하여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직 검체를 채취하지 않고도 인체 내 대사과정
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하다. (*)
|
|
|
|
|